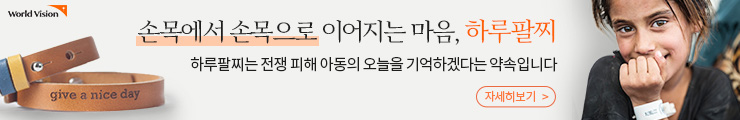“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로 시작되는 매력적 저음의 원로가수 최희준이 지난 2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명문대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도 법관의 길이 아닌 가수의 길을 선택해 불렀던 그의 노래 ‘하숙생’은 국민애창곡이 될 만큼 수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우골탑(牛骨塔)으로 불릴 정도로 귀한 소를 팔아 어렵게 대학을 다녔던 시골출신 하숙생 대학생들에게 그의 노래는 얼마나 심금을 울렸던가.
피 같은 논밭을 저당 잡히고, 유일한 재산이었던 소까지 팔아 자식을 공부시켰던 우리네 부모세대들에게 하숙생은 어떤 의미의 노래였을까.
어쩌면 ‘하숙생’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던 시골대학생들의 애환이 아닌 허무한 우리네 삶을 노래한 것이지 싶다.
그의 노랫말엔 삶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벌거숭이 인생과 구름처럼 떠돌다 가는 인생길은 삶의 비애를 보여주는 말들이다.
그런 인생길에 정도 미련도 둬서는 안 된다는 허무적 달관. 하숙생은 어쩌면 고달픈 지난 세월을 살아왔던 모든 이들의 애환을 적셔준 삶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하숙생이 떠난 방학시즌의 대학가는 썰렁하다. 하숙집 아주머니의 공허함이란 그 쓸쓸함이란. 어쩌면 영원한 하숙생이었던 최희준이 이번에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간 건 아닌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죽음이 정말 가슴 저리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네 인생길이 노랫말처럼 하숙생의 삶을 살고 있는 실존적 허무함, 그 휑한 슬픔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신없이 돌아가는 미친 속도의 세상 속에서 우린 왜 끝없는 허무의 공간을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는 것일까.
굳이 조용하게 살아도 방학은 오게 마련인데 왜 우리는 미치도록 달려가야 하는 것일까. 이 고속의 시대, 말도 안 되는 치열함은 누가 만든 것인가.
하숙생은 떠났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복학하는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며 우린 살아가야 한다. 내일의 허무 때문에 오늘을 희생해서는 안되는 게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아닌가.
방학이 오더라도 지금 우리는 도서관으로 가야한다. 일터로 가야한다. 일상에서의 충실한 삶, 그것만이 남아있는 하숙생이 해야 되는 숙명이 아닌가. 한 시대 우리들의 영혼과 가슴을 따뜻하게 해준 영원한 하숙생 고 최희준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