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가을 풍경
지갑을 열어놓은 것처럼 한해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듯하다. 봄인가 싶더니 연이어 몰아친 태풍사이로 정신없이 여름이 지나가고 시나브로 가을이 문을 열었다. 온통 코로나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모든 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잊어버린 것 같다.
먹고사는 것이 고달픈 현실이 된지는 오래. 첨단 디지털 문명 속에서 편리함은 더해가고 있는데 우리네 삶은 이상하게 뒤로 처지는 것은 왜일까. 여느 통계에서 ‘행복’의 지수가 국민 GDP가 낮을수록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보면 인류의 발전이란 것도 어쩌면 잘못된 인간의 선택일수 있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어쨌든 가을이 왔다. 한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40대의 중년이랄 수 있는 가을은 질풍노도의 시기로 볼수 있는 봄과 피끓는 청춘의 여름의 경험위에 쌓아올린 풍성한 결실의 계절.
독일의 시인 릴케는 ‘가을날’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 시계 위에서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을 익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주시고,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송이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계속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낙엽이 뒹구는 가로수 사이를
이리저리 불안하게 방황할 것입니다.』
릴케의 가을을 보면 신이 완성하는 계절의 마지막 작품이 바로 가을인 듯 하다. 그런 가을을 노래한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가 바로 자유서정시인인 김영랑이다.
『오매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불은 감닙 날어오아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것네
추석이 내일모레 기둘니니
바람이 자지어서 걱정리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메 단풍 들것네』
서양이나 동양이나 가을을 보는 심상은 똑같은 것처럼 계절이 우리에게 스미는 것은 우주적 섭리, 바로 풍요로운 시간들이다. 아무리 힘든 태풍의 여름이 와도 이를 견디고 극복하면 또 평화의 시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은 오게 마련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서있는 곳이 바로 가을의 문턱. 여름을 극복한 이들만이 단맛을 볼수 있는 푸른하늘과 솔바람, 그리고 들녘의 풍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로 힘들로 지친 모든 이들에게 이 가을은 잠시나마 삶의 휴식을 줄 것이다.
저 끝없는 뭉게구름과 찬란한 햇빛, 그리고 언덕너머에서 불어오는 경계 없는 바람과 국화향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겠는가 말이다.
보이지 않는 21세기 전염병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이시기, 그래도 가을은 오고 단풍은 물들고 있다. 혹시나 모를 감염공포로 모든 일상이 비대면으로 전환돼 사람간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외로운 시대에 훅 내 곁으로 찾아든 가을은 어쩌면 우리를 더욱 고독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쩌랴. 저 단풍이 물드는 것을 말릴수는 없으니 함께 가을 속으로 떠나보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될 것이다.
마스크가 없으면 다닐 수 없는 세상이지만 가을산하에 서서 홀로이 폐부깊숙히 가을 향을 들이켜보자. 삶이란 거창한 것 같아도 내가 내뱉고 들이키는 하나의 숨쉬기. 그 헐떡거림 속에 우주가 머물고 생명이 깃들게 마련이다.
그동안 세상 밖만 바라본 시간들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가을의 시간들이 돼야 할 것이다. 스스로 빛날 수 있는 단풍처럼 행복한 가을을 지어나가야 할 시간들이다. 정승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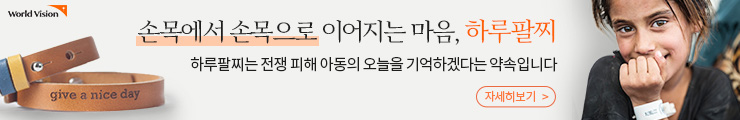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가을 풍경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가을 풍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