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시를 쪼아먹는 새의 모습
▲ 홍시를 쪼아먹는 새의 모습
늦가을이다. 여름날 작열하는 태양아래에서도 고개숙이지 않고 시퍼렇게 대들던 푸른 땡감이 어느새 붉그레한 홍시로 익어가고 있다.
산하가 온통 단풍들더니 저도 이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스스로 저렇게 붉어지는 것을 보면 참 세월에 장사가 없다는 옛말이 딱 맞다 싶다.
푸를때 푸르고, 붉을 때 붉어질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자연의 순리아니겠는가. 그것도 모르고 푸른시간에 붉어지고, 붉어져야 하는 날들임에도 시퍼렇게 날이 섰던 지난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만추의 늦가을 홍시를 따던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은 한두개 까치밥은 꼭 남겨두었다. 사람만 입인가. 저 짐승도 먹어야 살 것아닌가. 어르신들이 살아온 세월은 저런 자연의 이치를 빼놓치 않고 있다.
까치밥을 보며 인생을 생각한다. 저 가지에 우주의 섭리와 세상의 인심이 오롯이 메달려 있다. 【정승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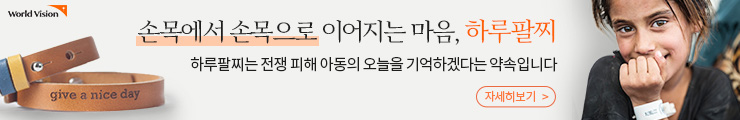
 ▲ 홍시를 쪼아먹는 새의 모습
▲ 홍시를 쪼아먹는 새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