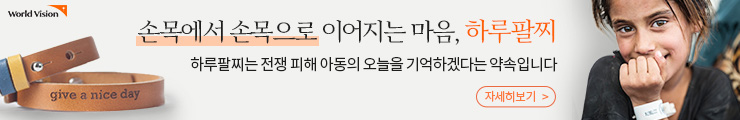가을이 안겨다준 자연의 선물은 끝없는 높은 하늘이다. 그것도 낮밤이 아닌 달밤, 백열등 전구같이 둥근 보름달빛을 어깨위에 얹어 처벅처벅 시골길을 걸어본 자만이 아는 그 깊고 소소한 행복.
어둠을 느껴본 이만이 알수 있는 그 흐릿한 백색의 밝음. 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녀 환한 길을 열어주는 보름달을 지고 가다보면 하 저기 하얀 백색 소금을 흩뿌린듯한 메밀꽃.
어쩌면 봄 아지랑이 같이, 또 어쩌면 새벽녘 산허리를 휘감은 안개처럼 희뿌연 저 꽃 저 메일을 어찌해야 할것인가.
소설가 이효석이 쓴 명작 ‘메밀꽃 필 무렵’의 봉평길에도 저 메밀꽃이 지천이었으리라. 주인공 동이는 말없이 메밀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동이처럼 그 밤 나의 상념에 잠겨 메밀꽃을 걷는 것도 큰맘 먹어야 하는 현대인의 운명이다.
그래서 메밀꽃을 보려면 밤길을 걸어야 한다. 밝고 환한 낮, 24시간 편의점의 불빛처럼 늘 불이켜진 현대인들에게 저 한밤의 메밀꽃은 얼마나 위로가 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