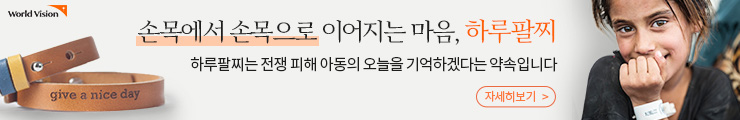
![[꾸미기]쌀값 오름세.jpg](/data/tmp/2507/20250714131515_duvaexge.jpg)
쌀값이 다시 6만 원을 넘보고 있다. 1년 전, 쌀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던 장면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밥값이 너무 오른다”는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다. 급등과 폭락, 그 끝없는 반복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해, 야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반대 속에 좌초됐다. '쌀값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맞섰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자체를 줄이자”는 고육책까지 내놓았다. 지금 생각하면, 정부의 예측은 의외로 정교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올해 쌀값이 오른 진짜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 아닌 '정책 개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복잡하다. 정부가 지나치게 빠르게, 많이 쌀을 사들였고, 그 여파로 시장의 구조 자체가 뒤틀렸다.
수확 전부터 정부가 ‘남는 쌀 없다’는 시그널을 주었고, 지역농협은 가점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산지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는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고, 다시 농협에 기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문제는 이 모든 구조가 '시장 자율'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쌀값 상승은 공급부족보다는, 정책 신호와 유통구조의 왜곡이 빚은 인위적 결과에 가깝다. 실제 쌀 재고는 여전히 충분하다. 정부 창고엔 85만 톤, 민간에도 44만 톤이 남아 있다. 다만 이 재고가 유통선상에 올라오지 않고 ‘막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쌀 유통의 취약한 구조다. 정부 대출에 의존하는 농협, 가격 담합 의혹까지 나오는 공동사업법인, 그리고 조그만 식자재 마트들이 요구하는 '입점비'. 이 모든 요소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쌀값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정부가 농가를 살리기 위해 쌀값을 떠받치면 소비자는 밥 한 공기에도 부담을 느끼고, 유통업자는 마진과 신용 사이에서 허덕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 손을 떼야 할지’에 대한 철학이다. 무조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조급하고 일방적인 방식은 피해야 한다. 농가도, 소비자도, 유통업자도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믿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먼저다.
이번 쌀값 반등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던져준다. 하나는, 정부가 작정하면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책 신뢰의 실험 결과'다. 다른 하나는, 시장이 정부의 시그널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준 '통제의 부작용'이다.
정부는 지금의 쌀값 상승을 일시적 성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수급 조절 실패의 불씨는 언젠가 다시 폭락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밥상 물가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민생이다. 쌀 한 톨에 담긴 무게를, 정부는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